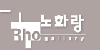KANG SEUNG HEE
KANG SEUNG HEE
새벽, 여백을 열다
July 16 – July 30, 2025
Reception July 16, 2025 WED. – 16pm
RHO Gallery
강승희의 동판화
새벽, 여백을 열다
고충환(Kho Chunghwan 미술평론)
눈 덮인 백두산을 그린 것이라고 했다. 눈 위로 희끗희끗 드러나 보이는 능선을 그린 것이라고 했다. 사방천지가 눈이니 그럴 만도 했다. 그렇게 하얀 종이 위에 드문드문 떠 있는 몇 개의 선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 그렇게 작가는 소나무를 그렸다. 버드나무를 그렸고, 가지 끝에서 흔들리는 잎새를 그렸다. 매화를 그렸고, 개나리를 그렸다. 대나무를 그렸고, 바람이 흔드는 댓잎을 그렸다. 이름 모를 들풀을 그렸고, 들꽃을 그렸다. 수초를 그렸고, 허공에 매달린 그네를 그렸다.
바람이 흔드는 댓잎이라고 했다. 수초라고 했다. 허공에 매달린 그네라고 했다. 그렇다면 바람은, 수면은, 그리고 허공은 작가의 그림 속 어디에 있는가. 바람과 물과 공기는 비가시적인 존재 방식을 가진 것들이다. 물질이면서 비물질이기도 하다.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에 있다고 해야 할까. 이처럼 비가시적인 것들을 그리는 방법으로는, 비물질적인 존재 방식을 가진 것들을 화면 위로 불러오는 방법으로는 암시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술은, 특히 회화는 암시의 기술이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것을 암시하는 기술이다. 그린 것을 통해서 미처 그려지지 않은 것과 같은, 정작 화면에는 없는 것을 화면에 들여놓는 기술이다. 그리지 않으면서 그리는 기술이다. 그렇게 없으면서 있는 것들, 없는 듯 있는 것들, 그러므로 바람과 물과 공기는 그림에서 결정적이다. 정적인 그림을 움직이게 하고, 도식적인 그림을 숨 쉬게 만드는, 유기체로 치자면 호흡과 기운 같다고 해야 할까. 그림이 쉬는 숨이 드나드는 통로 그러므로 숨통과 같다고 해야 할까.
그렇다면 그 숨통을 그림 속 어디에 어떻게 들여놓을 것인가. 여백이다. 없는 듯 있는, 빈 듯 찬 그림 속 공간이다. 다시, 그러므로 회화는 여백의 기술이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여백은 수묵화에서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허허로운 화면에 여백을 강조한, 정서적 환기와 함께 분위기가 강한, 서정적인, 함축적인, 시적이고 문학적인, 극적 순간을 포착해 그린, 지속되는 시간을 그린, 미니멀리즘을 떠올리게 만드는, 과감한 생략법으로 그린 단출한 그림으로 모티브에 주목하게 만드는, 사실은 모티브를 빌려 바람과 물(수면)과 공기와 같은, 그리고 여기에 어쩌면 자연과 교감한 작가 자신의 내면과 같은, 미처 그려지지 않은 것을 관조하게 만드는 작가의 그림은 판화이면서 수묵화 같다.
수묵화 같다고 했다. 농묵(짙은 묵)과 담묵(엷은 묵)을, 윤필(먹물을 충분히 머금은 붓질)과 갈필(먹물을 최소한으로만 머금은 건조한 붓질)을 적절하게 구사한, 그러면서도 정서적 환기와 함께 금욕적인 생활감정을 표상하는 것 같은 느낌의 건조한 붓질이 그렇다(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풍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설핏 청전 이상범의 서정적 그림자가 환기되는). 먹그림에서처럼 붓이 지나간 자리 가장자리로 선을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가녀린 선이 면을 가두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이 그렇다. 동판에 새김질할 때 라인 옆으로 돌출되는 부분(바, burr)을 뭉개면서 살린 거칠고 질박한 느낌의 질감이 호흡이 실린 먹선, 그러므로 자로 잰 듯 균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생생한 먹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그렇다.
이와 함께 수묵화에서처럼 농묵과 담묵을, 갈필과 윤필을 적절하게 사용해 음영을 그리고 원근을 표현한 것이, 그리고 여기에 먹그림이 그렇지만 자연 그대로의 색깔을 다만 흑백의 농담과 음영만으로 표현한 것도 주목된다. 먹색은 오색이라고 했다. 여기서 오색은 다만 다섯 가지 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색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음영을, 색깔을 오만가지 색깔의 먹색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다. 여기에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부드럽게 번지는 효과와 같은 수묵 선염법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 자세히 보면 먹물처럼 검지는 않고, 칠흑 같은 깊이 속에 작가가 일관되게 천착해온 새벽의 빛깔을, 어쩌면 새벽의 하늘빛 같고 물빛 같은 파르스름한 색깔의 기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 일이다.
한편으로 작가는 자신이 사용하는 붓이며 니들과 같은 도구를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데, 자신이 만든 니들을 찍어 무수한 점을 만드는 방법으로 음영을 표현하고 원근을 표현하고 질감을 표현한다. 그렇게 형상화된 산세 표현이 미점산수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에 판에 새김질을 통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다만 붓질이 아니고서는 표현 불가능한, 그렇게 선이 균일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끊어질 듯 연이어지는, 마디를 만들면서 연이어지는 선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일이다.
그렇게 작가는 마치 수묵화와도 같은 최소한의 묘사에 한정된, 정적인 분위기의, 여백이 강조된 화면으로 대기의 순환과 공기의 흐름과 같은, 공기의 밀도감과 같은,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과 같은, 그 자체 비가시적인 그리고 비물질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자연의 단순한 감각적 재현을 넘어, 자연과 작가가 교감한 증거라고 해도 좋을 어떤 운율 같은 것, 리듬 같은 것, 내적 울림 같은 것, 여운 같은 것을 화면 위로 밀어 올린다.
새김질한 그림을 찍어낸 그림(그러므로 간접회화)이 판화임을 생각한다면, 반면 붓으로 직접 그린(그러므로 직접 회화) 수묵화와의 다름과 차이를 생각한다면, 이처럼 수묵화와 같은 분위기의 판화에는 남다른 부분이 없을 수가 없고, 여기에 작가만의 판화의 독창성이 있다. 붓으로 그린 그림에 비해 새김질하고 찍어낸 그림이 상대적으로 표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관건은 판화의 장르적 특수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붓으로 그린 그림에서처럼 표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그 방법을 찾았고, 마침내 찾아냈다.
그렇다면 작가가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볼 일이다. 작가가 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초기 얘기지만, 작가는 많은 경우에 무려 150회에 달하는 반복 에칭(딥에칭)을 통해서, 한 작품을 만드는데 보통 3개월 이상씩 소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레이어가 총총한, 섬세한 레이어가 화면에 음영을 만들고 깊이를 만드는 그림(판화)으로 국내외 각종 유명 수상을 휩쓸었다. 판화 교수법이 미처 마련되지도 않았던 열악한 시절 얘기다. 그리고 이후 작가는 드라이포인트에 매료됐고, 최근에는 방부 막을 만드는 그라운드로 그림을 그리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냈다. 그렇게 적어도 국내 동판화에 관한 한 작가 스스로 교수법을 개척했고 정착했다고 해도 좋다. 최소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좋다.
그렇게 그저 수묵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판화와 수묵화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우르는 형식적 성과를 일궈냈다. 회화와 판화의 경계를 허무는, 소위 회화적인 판화를 실현했다고 해야 할까. 회화적인 판화로 치자면 석판화를 떠올리겠지만(회화와 마찬가지로 평면 위에 직접 그리고 찍어내는), 문제는 동판화에서 이러한 경지며 차원을 실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동판화에 기울인 지난한 형식실험의 과정이 있었기에, 시행착오의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작가의 그림은 투명한 깊이 속에 어스름을 내장하고 있는, 새벽의 하늘빛 같고 물빛 같은 파르스름한 색깔의 기미를 포함하고 있는, 새벽의 빛깔 속에 서게 만든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몸을 섞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직 꿈을 꾸는 동안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비가시적인 것들이 활력을 얻는, 여백 앞에 서게 만든다. 새벽의 빛깔이 물든, 새벽의 시간이 체화된, 여백 앞에 서게 만든다.